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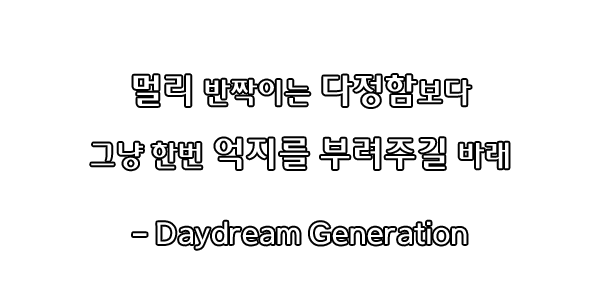
인간의 기준으로 치면 거의 영겁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신들에게 있어 10년이라는 세월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니었다. 한 순간의 찰나, 혹은 잠깐의 순간. 분명 많은 사건을 겪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는 너무나 부질없는 시간. 10년.
지장보살은 제가 선대를 이어 이 이름을 이어받은 게 딱 10년 정도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탄식했다.
아직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지는 걸까.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일 테지만, 그는 제가 선천적으로 이 이 일과 맞지 않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어왔다.
‘선대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데.’
자신은 자비의 근원이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했다. 물론 타인들 보다야 자신은 훨씬 자비롭겠지. 천년정도 그렇게 길러졌으니 본성과 관계없이 언행이 그리 바뀌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사로운 감정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 제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일 터. 어제도 마계를 둘러보다가, 싸움을 걸어오는 요괴에게 무의식적으로 살기를 내뿜었지 않은가.
“지장.”
“…….”
“…지장?”
“아.”
무거운 어깨와 복잡한 머릿속을 필사적으로 정리하던 그는 제 앞에 내밀어진 작은 손에 두 눈을 떴다.
“코엔마. 바쁜 일은 다 끝났어?”
“음.”
비록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상대는 염라대왕의 후계자다. 본래는 이렇게 쉽게 말을 놓는 것도 힘든 상대이긴 했지만 지장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랐지. 마계와 영계의 감시자인 그는 염라대왕과 동급인 존재였으니까. 즉, 오히려 이 경우에는 코엔마가 존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가까웠다.
다만 지금의 지장은 선대에게 일을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변수였다. 코엔마와는 같은 후계자로서 지내온 기간이 대부분이었던 그는 서로 편하게 말을 놓는 쪽이 더 익숙했고, 주변에서도 이것을 특별히 지적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았다.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선 서로 존대를 하기도 했으니, 무엇이 문제겠는가.
“꽤 처리할 일이 많은 것 같던데, 고생했어.”
“급한 일만 처리한 거니, 다 한건 아니지만 말이야.”
“그런 거였구나. 하긴, 애초에 그 많은 일을 전부 처리하는 것은 무리지.”
다 이해한다는 듯 말하며 자그마한 두 손을 마주잡은 지장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다른 사람 앞에선 제 직책을 생각해서라도 몸가짐을 조심하지만, 코엔마의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진다. 의지하고 싶다거나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는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허술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곤란하다.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은 건가?”
“…조금.”
“조금?”
“조금은 힘든데, 그래도 괜찮아. 못 버틸 정도는 아니야.”
당연하다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사람에게 뿐이다.
지장의 그런 마음을 코엔마도 느낄 수 있었던 걸까. 얌전히 잡혀있던 손을 뺀 그는 슬그머니 지장이 앉아있는 의자의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그런 건 일찍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덥석 어깨를 안고, 머리를 기대어왔다.
아까 전 그 작은 손은 지금은 제 얼굴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커져있다. 오랜만에 보는 코엔마의 본모습은 꽤나 듬직하게 느껴져, 지장은 잔뜩 목에 힘을 줘 들고 있던 고개를 숙일 수 있었다.
“어떻게 말하겠어. 의젓해져야지, 나도.”
“내 앞에서 까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난 이쪽이 더 좋아.”
아직은 미숙하지만 끝없는 자비를 베풀려 하는 지옥의 구세주. 멀리서 바라보아도 빛이 나는 ‘지장보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상대의 그런 면이겠지만, 제게 필요한 것은 곁에서 이렇게 온기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 소녀였다.
“다행이네.”
무엇이 다행인지는 물을 수 없지만, 이런 제멋대로인 위로에도 기뻐해 주니 자신이야말로 다행이다.
코엔마는 누가 보진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한참이나 지장을 안고 가만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