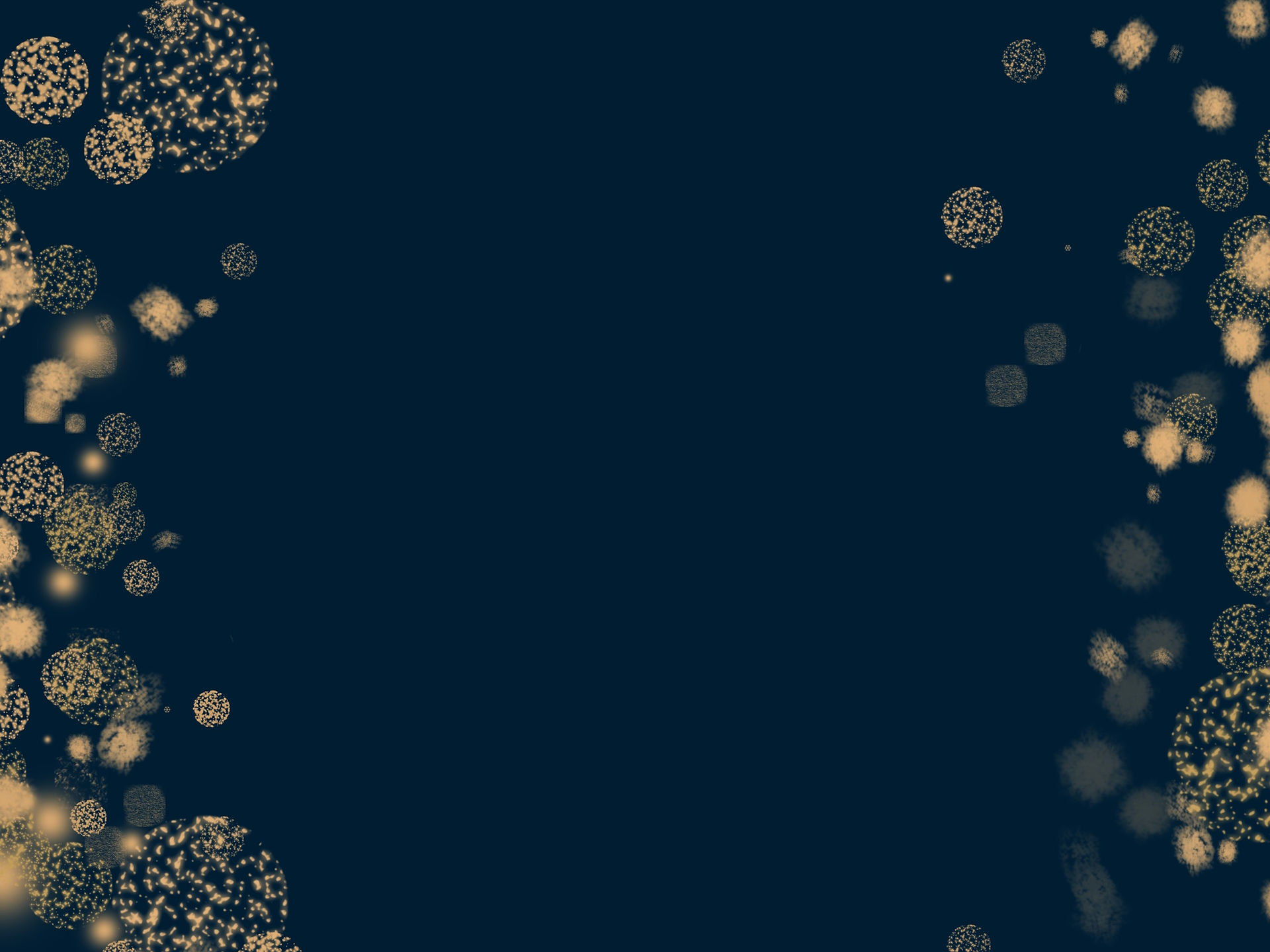
“언니. 산타할아버지, 실제로는 없어요?”
데스페라도와 루엔은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든 귀여운 목소리에 입을 닫았다.
언제부터 와서 대화를 듣고 있던 걸까. 테이블 옆에는 주문한 음식을 들고 온 주점 주인의 어린 딸이 서 있었다.
“뭘 당연한 걸 묻…, 윽!”
“아니! 있지! 있고말고!”
진실을 말하려는 데스페라도를 저지한 건 루엔의 잽싼 공격이었다.
냅다 그의 옆구리를 찌른 루엔은 제 발언에 책임을 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소녀를 달래보았다.
‘올해는 더 춥다는데, 산타가 있다면 벽난로 있는 집이나 줬으면 좋겠네. 산타가 없다는 게 문제지만.’
그렇게 말한 건 분명 자신이었다. 데스페라도에게 대답한 거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다른 누군가가 듣고 동심을 잃을 뻔했으니 수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소녀는 들고 있는 음식을 힘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손을 꼼지락거렸다.
“하지만 방금 언니가 산타는 없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언니는 어른이잖아? 산타는 어른에겐 안 오잖아?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참으로 그럴듯한 변명이다. 데스페라도는 너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드는 제 연인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어차피 언젠가는 저 애도 산타라는 건 만들어 낸 이야기 속 존재라는 걸 알게 될텐데, 왜 저런 헛수고를 하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데스페라도와 달리, 루엔은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켜주고 싶었다.
“산타는 착한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주니까. 알지? 산타는 있어.”
“정말이죠?”
“그럼.”
루엔은 소녀의 손을 마주 잡고 다정하게 웃었다.
그 확신에 찬 미소에 소녀는 금방 희망을 되찾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법지대의 악몽이 한 말이니, 믿을 수 있다는 듯 말이다.
비록 그의 명성은 카르텔을 처리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이곳의 아이들에겐 더더욱 동경할 이유가 되었다.
루엔은 그걸 알고 있었기에, 유독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던 것이었다.
“다행이다. 나, 올해는 새 인형이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 산타할아버지가 꼭 선물해주면 좋겠네.”
머리를 쓰다듬어진 소녀는 즐거운 얼굴로 팁과 함께 돌아갔다.
흐뭇해하는 루엔과 종종걸음으로 떠나는 소녀를 번갈아 보던 데스페라도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대체 저렇게 사람이 좋은데 어떻게 살아남은 건지.’
물론 감수성이 풍부해도 살아남을 수는 있지. 루엔은 강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제 연인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매정해지기도 한다는 걸 알긴 했지만, 그래도 신기한 건 마찬가지였다.
“데스페라도.”
“그래, 애 달래기는 다 끝났냐.”
“인형 사러 가자.”
“뭐?”
지금 뭐라는 거야, 이 녀석.
데스페라도는 목구멍까지 튀어나온 말을 삼키고, 왜 루엔이 저런 소리를 해냈는지를 추리했다.
“설마 그 애한테 주려는 건 아니지?”
“맞는데.”
“…….”
제 생각이 맞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건 왜일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흘러나온 그는 대답 대신 마른세수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들어봐, 한 번도 산타에게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잖아? 불쌍하잖아? 인형 그거 얼마 한다고!”
“다 맞는 말이지만 네가 그걸 챙겨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들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지.”
저놈의 정 많은 성격 어떻게 못 하나. 하지만 제겐 달리 방법이 없다.
둘 다 이런 걸로 싸울 나이도 아니고, 애초에 루엔과 말싸움을 해봐야 자신만 손해 본다. 이 사실을 아는 데스페라도는 알아서 두 손을 들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야, 그 포기한 거 같은 말투.”
“내가 널 언제부터 말릴 수 있었다고.”
“많이 말리셨거든요? 그럼, 이거 먹고 사러 가자.”
자신들은 그냥 이른 저녁을 먹으러 왔을 뿐인데 일이 늘어버렸다. 하지만 단골 주점인데다, 그 딸과도 쌩판 남이라 하기엔 제법 얼굴이 익숙한 사이이니 너무 불평하는 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터.
연인의 변덕에 맞춰주기로 한 그는 음식이 식기 전 식사를 하려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물었다.
“너도 어릴 때 인형 같은 거 좋아했냐.”
“물론이지. 지금도 좋아하는데? 이젠 들고 다니니 번거로우니 구경만 하지만. 외갓집 가면 몇 개 남아있어.”
“흐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데스페라도는 모호한 대답만 하고 수저를 들었다.
*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인형을 사 왔던 두 사람은 집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행인이 거의 없을 새벽이 되어서야 거리로 나왔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따라오지 말지 그랬어. 나는 쇼핑에 같이 가준 걸로도 충분했는데.”
“이 야밤에 혼자 돌아다니겠다고? 아무리 너라도 어림없지.”
카르텔이 한 무더기로 덤벼들어도 루엔을 상처입힐 수는 없겠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원래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안전하고, 같이 있으면 애초에 다가오는 놈들도 적어지지 않던가.
“자 됐다. 주인장에게도 미리 말해놨으니, 잘 얼버무려 주겠지.”
아이가 이미 자는 걸 확인한 루엔은 주점의 주인장에게 선물을 넘겨주고 뿌듯한 얼굴로 돌아왔다.
누가 보면 아주 세상이라도 구한 줄 알리라. 만족감 가득 찬 연인을 가만히 보던 데스페라도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자.”
루엔은 코앞에 달랑거리는 귀여운 실루엣에 멈칫했다.
열쇠고리로 추정되는 그 물건은, 작은 곰 인형이 달려있었다.
“뭐야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설마 아까 인형 좋아하냐고 물어본 게 이것 때문이었나. 동기는 추측할 수 있는데, 대체 언제 산 건지는 알 수가 없다.
두 손으로 선물을 받은 루엔은 히죽 웃으며 인형을 조몰락거렸다.
“나는 아직 준비 못 했는데.”
“됐어. 굳이 챙겨줄 것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딱 기다려, 오늘 밤까지 챙겨줄 거니까.”
그래. 누가 이 여자 고집을 꺾겠나. 데스페라도는 더 대꾸하지 않고 새로 꺼내 문 담배에 불을 붙일 뿐이었다.
“고마워, 데스페라도.”
아이처럼 웃으며 들뜬 목소리로 전하는 감사 인사.
자신은 저걸로도 충분하지만, 그런 걸 말하기는 너무 낯간지럽다.
속마음을 담배 연기에 담아 내뱉은 그는 희미하게 웃는 것으로 답인사를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