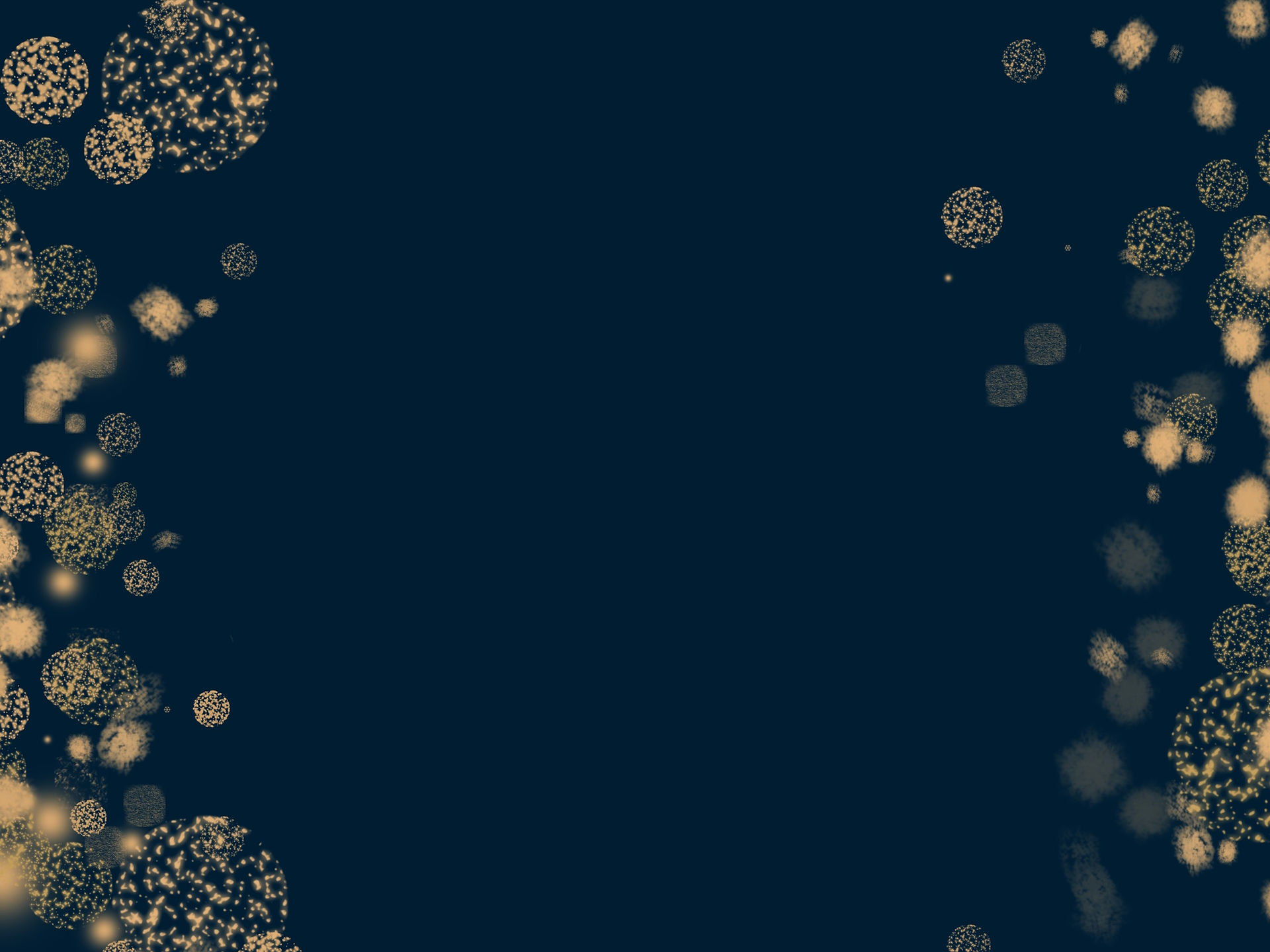
그건 아마, 셀렌이 ‘소년병’이라 불릴 시절의 기억이었다.
함박눈이 내리는 전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총성과 단말마. 짙은 화약 냄새와 피의 비린내, 쓰러진 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알 수 없는 최악의 전장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죽고 죽이는 최전방 전장에서 갑자기 크리스마스 인사라니. 누구인지는 몰라도, 유별나게 이상한 놈이거나 두려움에 미쳐버린 놈인 게 분명하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기도 하지.
셀렌은 누군가가 외친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그 인사가, 유난히도 기억에 남았었다.
밤낮 구분도 없이 싸우느라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랐는데. 크리스마스였구나.
어차피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챙긴 적은 없지만 묘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성인(聖人)의 탄생을 축복하는 오늘마저도 인간들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니. 게다가 제국의 편에서 싸우는 군사들의 대부분은, 아직 사관학교를 재학 중인 어린 병사들이었다.
‘오늘 죽으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셀렌은 탄창을 갈아 끼우고 방아쇠를 당겼다.
어차피 자신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도 믿지 않고, 신도 천사도 악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
제 동기 중에서는 전장에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도 제법 많았었다.
이리 많은 피를 보고 나서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승자가 되어도 패자가 되어도 지옥으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전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당시의 셀렌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네, 중위!”
더는 소년병이라고 불리지 않을 나이의 12월 25일 아침.
늘 그래왔던 대로 의무실로 출근한 셀렌을 반기는 건, 처참한 꼴을 한 케이크와 즐거워 보이는 디스티였다.
“이 불쌍한 케이크는 뭡니까?”
셀렌은 무표정한 얼굴로 형태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케이크를 가리켰다. 시트에서 흘러내리는 생크림과 엉성한 장식이 아무렇게나 꽂힌 그 케이크는, 먹거리라 하기보단 음식에 대한 모독성 예술품에 가까워 보였다.
“총통이 줬다네! 나와 자네 둘이서 먹으라고!”
“어쩐지.”
“이히히히, 뭐가 ‘어쩐지’라는 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통의 저주받은 요리실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저리 답하고 말았다.
구원받을 수 없는 케이크에게서 시선을 돌린 그는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였군요.”
“그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성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지! 산타에게 선물은 받았나?”
“애석하게도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작년엔 산타 분장을 한 총통이 병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뿌리고 다녔었지. 물론,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래서였을까, 올해 셀렌은 쓸데없는 선물 테러를 당하지 않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나는 받았는데! 내년엔 좀 더 착하게 사는 게 어떤가, 중위?”
“제겐 산타에게 잘 보이는 것보단 총통의 명령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히히히! 멋진 대답이군, 이거야 원 총통이 선물해 줄 사람을 잘못 고른 모양인데?”
테슬러에게 받은 걸로 추정되는 애견용 간식을 들어 보인 디스티가, 의료기구 속 아무렇게나 놓인 포크 두 개를 꺼냈다.
“일단은 케이크부터 먹어 치우고 일하자고. 당장이라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 케이크지 않나? 소원을 들어줘야지.”
먹고 탈이 나진 않을까 싶지만, 뭐, 죽기야 하겠나. 제 상사는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은 재능 넘치는 미치광이 의사인데.
뭐라 더 할 말이 없는 셀렌은, 얌전히 포크를 집어 들었다.